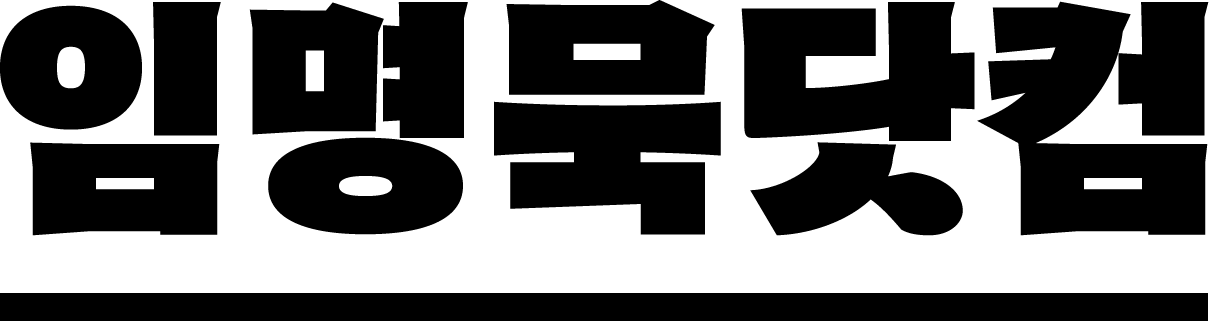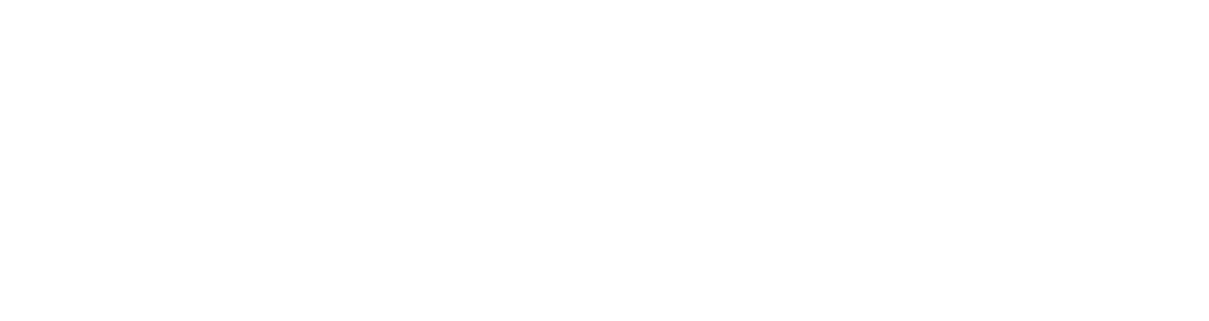볼가 대종주 (1): 러시아 도착
우여곡절 끝에 일단 도착했다.
방콕에서 두바이를 거쳐 모스크바로 향하는 여정은 대략 12시간. 인디고 항공사의 비행기를 타고 4시간을 비행해 먼저 벵갈루루로 날아간다. 거기서 세 시간을 대기한 후 다시 4시간을 비행해 두바이로 가는 것이다. 두바이에서는 5시간 대기 후에 다시 5시간을 비행해 모스크바 도모데도보 공항으로 간다. 여기서 모스크바에서 시내까지 공항 철도 타고 나가는 시간이 더해지니 거의 꼬박 하루를 방콕에서 모스크바로 이동하는 데만 쓴 것 같다.




구소련권 여행이 크게 보면 이번이 네 번째인데, 두 번째부터는 항상 비슷한 감정을 느끼며 시작했던 것 같다. 여행을 떠날 때만 해도 기대가 잔뜩 된다. 공항에 도착해서 그 특유의 묵직한 러시아어 방송이 나오면 슬슬 실감이 난다. 하지만 내가 러시아에 왔다는 게 진짜 실감이 나려면, "아 씨 여행 괜히 왔다" 싶을 정도로 뭔가 러시아에서 정신적 압박을 겪어야만 한다. 고압적인 공무원들과 무뚝뚝한 사람들,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규정들과 함께 하다 보면 내가 대체 왜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나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신기하게도 구소련권에 들어온 지 일주일 정도면 이미 상당히 적응하게 되는데, 어째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살다 보면 결국에는 다시 리셋되는 것 같기도 하다.
이번에는 입국 심사부터 뭔가 에피소드를 하나 만들어주고 시작했다. 직원은 내 여권을 받더니만 유심히 보면서 깐깐하게(?) 질문하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왜 왔나?" "여행하러 왔다고?" "며칠 있나?" "어디 가나?" 등등... 뭔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믿음직스럽지 못한 것 같다. 슬슬 어이 없는 질문이 등장한다. "한국의 수도가 어디야?"
여기서 귀를 의심해서 다시 물어봤다. "뭐라고 하셨죠?" 역시나 같은 질문. 당당하게 '쎄울'이라고 말해주었다. 그러다가 아래 질문이 나왔을 때는 잠깐 쫄지 않을 수 없었다.
"3년 전에 우크라이나는 왜 갔어?"
아.... "여행 하러 갔습니다." 외에는 할 말이 없었다. 그렇게 한참을 내 얼굴과 여권 사진을 대조해보다가 마지못해서인 듯 도장을 찍고 내 통과를 허락해주었다.

도모데도보 공항은 거대한 공항이다. 나오자마자 세계 각지, 특히 러시아 남쪽의 이슬람 세계와 러시아가 연결되는 모습을 본다. 그리고 동시에 공항에서 여전히 버거킹이 정상 영업하고 있는 것도... 다른 전철 역에서는 KFC도 보았다. 아무래도 맥도날드만 안 보이는 듯 하다.

이번 여행의 가장 큰 난관은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 스위프트가 러시아를 '캔슬'한 덕택에 국제 카드 이용이 전혀 안 된다는 것이었다. 물론 앞으로 있을 여행에서 동행분이 러시아 즈베르방크 계좌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궁극적인 문제는 되지 않는다. 교민회를 통한 환전 루트도 확보하였으니 더욱 그렇다. 하지만 동행을 만나기 전인 지금 이 시점에서는 문제였다. 도저히 숙소 예약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서방에 살고 있는데 스위프트와 마스터카드가 막혀서 너희 호텔에 대금을 낼 수 없으니 이틀 동안 방 좀 예약 잡아줄래?'라고 메일로 읍소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일단은 공항 철도를 타고 모스크바 시내 남쪽의 파벨레츠키 역의 대합실에서 핸드폰 충전을 하면서 근처에 있는 호텔에 하나씩 전화를 걸어보았다. 나의 입이 안 열리고 귀가 안 트인 러시아어를 필사적으로 동원해서.... "Allo, U vas komnata est'?" 여보세요, 방 있나요?를 말하면 언제나 답은 하나 같이 "K sozhaleniyu, vse komnaty zanyaty."였다. 유감스럽게도 남은 방이 없습니다. 아... 불금 밤 10시에 대뜸 당장 방 하나 있냐고 하면, 모스크바 같은 대도시에서 방이 뚝딱 나오는 것이 더 이상했다. 하 진짜 이거 예산 조건을 대폭 상향해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 "방 있어요"라는 답을 주는 호스텔이 등장했다. 아 감사합니다!

또 러시아의 이해할 수 없는 도보 경로 표시 방식 때문에 한참을 헤매서 숙소까지 가야 했다만, 어쨌든 기숙사 형식으로 되어 있는 숙소에서 짐을 풀고 침대에 누우니 녹초가 된 상태였다. 그렇다고 공용 방에서 갑자기 컴퓨터 킬 수도 없었고, 사실 그럴 기력도 안 났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잠도 안 왔다. 아마 비행 중에 계속 꿈뻑꿈뻑 졸아서 그랬던 것 같다. 신발을 주섬주섬 챙기고 주변을 산책했다. 혹시라도 걱정했던 전쟁 분위기라는 것은 전혀 없었다. 젊음의 거리에는 (아마 집에 꽤 잘 살) 청년 남녀들이 삼삼오오 모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크게 틀어댔다. 차들은 분주히 이곳에서 저곳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건너편 전선의 우크라이나와 여기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그러다가 이런 것도 발견한 것으로 보아 아예 그런 분위기가 없다고 할 수도 없겠다만...

새벽까지 걸은 덕분에 이제야 잠이 쏟아지기 시작한 나는 숙소로 돌아와 누구보다 푹 잘 수 있었다. 에어컨도 없는 방이었지만 날씨가 그리 덥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