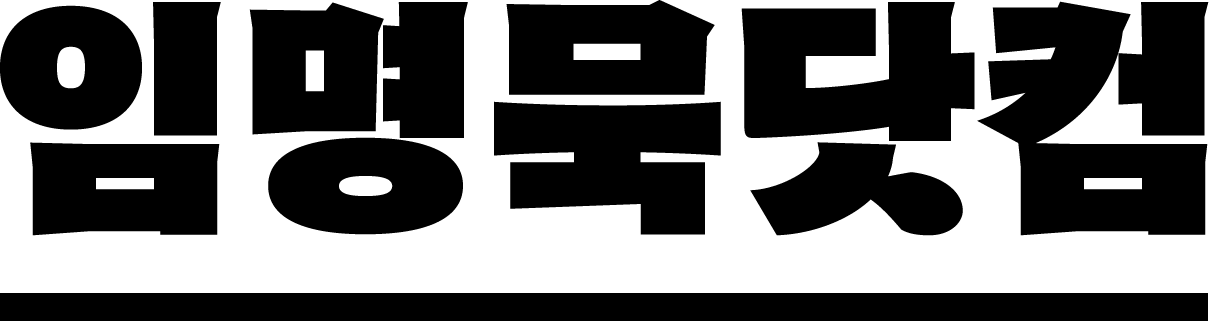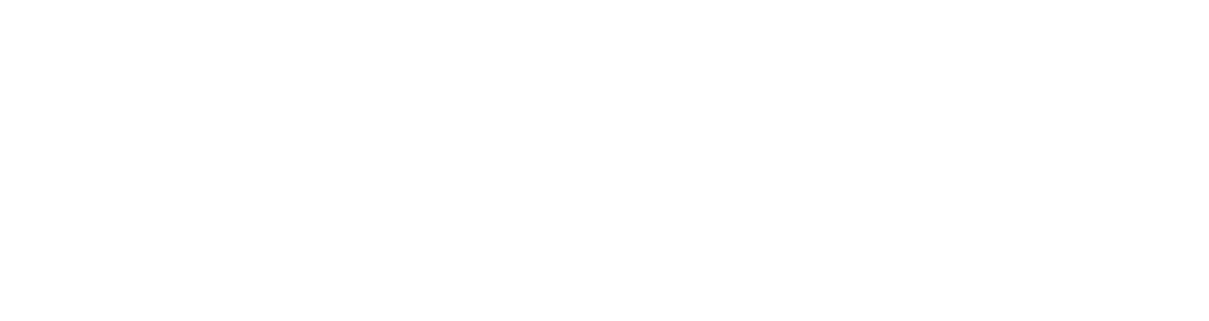볼가 대종주 (2): Ya Shagayu Po Moskve
'나는 모스크바를 걷는다.'
모스크바는 이번이 세 번째다. 2019년 3월에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도착했었고, 7월과 8월에 모스크바를 기점으로 카프카스와 우크라이나를 다녀왔다. 러시아 도시 중에는 어쨌든 여행 기점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니 당연한 일이다. 사실 그래서 모스크바를 상징하는 것들, 예컨대 붉은 광장이니 구세주 그리스도 성당이니 그런 건 이미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또 보러 가는 건 별 의미가 없겠다 싶었다. 이번 모스크바 행에는 조금 들리고 싶은 장소들이 몇 군데 있었으나 그건 8월에 볼가강에서 돌아와서 볼 계획이기도 했고. 다시 말해 시간이 떴다. 그리고 그럴 때는 러시아인들의 습성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도 꽤 괜찮은 일이다. 바로 굴랴찌(Gulyat')다.
굴랴찌는 대단한 게 아니다. 그냥 산책하다라는 뜻의 동사다. 하지만 러시아 문화를 처음 배우면 산책이 러시아인들의 일상 문화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상을 점하고 있는지를 금세 알 수 있다. 실제로 러시아를 다녀 보아도, 살을 에는 추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공원에서 굴랴찌하는 러시아인들을 보는 게 어렵지 않다. 물론 그들이 대륙 동안의 숨이 막히는 습기 찬 찜통 여름을 경험한다면 굴랴찌를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간 그래서 나도 그냥 숙소를 중심으로 모스크바를 정처 없이 걷고 가끔 지하철이나 택시도 타면서 아무렇게나 돌아다녔다.
위 노래는 그렇게 돌아다니는 동안 배경음으로 틀어 놓은 여러 노래 중 하나다. 흐루시초프의 해빙기의 마지막 해에 나온 동명의 영화의 주제가다. 이 영화는 혁명과 전쟁, 스탈린 테러 등의 엄혹한 시기가 끝나고, 소련도 소비 사회와 청년 문화가 대두하는 60년대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상징과 같은 영화다.
Бывает всё на свете хорошо
В чём дело сразу не поймёшь
А просто летний дождь прошёл
Нормальный летний дождь
이따금 세상 모든 일들이 좋아져
무슨 일인지 네가 바로 이해할 순 없지만
그저 단지 여름비가 내리면
평범한 여름비가.
Мелькнёт в толпе знакомое лицо
Весёлые глаза
А в них блестит Садовое кольцо
А в них бежит Садовое кольцо
И летняя гроза
군중 속에서 아는 얼굴이
즐거운 눈빛이 빛나
그 눈에서 순환선이 달리고
그 눈에서 순환선이 빛나지 *
그리고 여름의 소나기,
(중간 대화)
А я иду шагаю по Москве,
И я ещё пройти смогу,
Солёный Тихий океан
И тундру, и тайгу
나는 모스크바를 걷고 있어
그리고 나는 짭조름한 태평양을
툰드라, 타이가를 갈 수도 있지
Над лодкой белый парус распущу
Пока не знаю с кем
А если я по дому загрущу
Под снегом я фиалку отыщу
И вспомню о Москве
조각배 위로 하얀 돛을 펼칠 거야
누구와 함께일지는 아직 모르지만
만약 내가 집이 그리워진다면
눈 속에서 제비꽃을 찾을 거고
모스크바에 대해 기억할 거야

내 숙소는 치칼롭스카야/쿠르스카야 역 근처에 위치해 있는데, 저 노래에 가사로 등장하는 '순환선'인 싸도보예 깔쪼(Sadovoye Kol'tso, Garden Ring)를 따라서 일단 쭈욱 걸었다. 걷다 보니 '스탈린의 일곱 자매' 중 하나인 거대한 붉은 문 행정부 건물이 등장했다. 스탈린의 일곱 자매는 스탈린 시기에 모스크바 시내에 건설된 웅장한 7개의 고딕 양식의 마천루들을 뜻하는데, 모스크바 대학교와 외무성 건물도 그 일원이다.

붉은 문 역을 지나서 계속 걸으니 얼마 안 있어서 나온 러시아 연방 농업경제성 건물. 과거 소비에트 시절의 농업인민위원회를 승계한 정부 부처다. 석유산업부는 로스네프트, 가스산업부는 가즈프롬 등으로 독립하여 국영기업화 되기도 했는데 자본주의 국가들에도 있는 핵심 부처는 대체로 러시아 연방 정부가 그대로 끌고 갔다. 사실 저번 학기 수업 시간에 1920년대 농업인민위원회에 대한 연구서에 대한 요약 소개를 과제로 맡기도 했어서 더욱 반가운 건물이었다. 모든 게 작동하지 않던 소련 농업이 어쩌다가 지금은 세계를 곡물로 뒤흔들 수 있게 되었을지... 푸틴 집권과 러시아 농업 개혁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궁금해졌다.

건물이 워낙 크다 보니 바로 앞의 길에서는 건물 사진을 제대로 담을 수가 없어서 길을 건넜다. 그리고 건너편의 버스 정류장 광고판에는 이런 전쟁 관련 홍보물이 보였다. 러시아의 영웅에 영광을! 상급 소위 알렉산드르 노스코프. 전몰자인가? 하고 QR 코드를 스캔해보았는데, 전몰자는 아니었고 돈바스 최전선에서 통신을 중계해서 포격을 유도하는 통신 장교라고 한다. 적 전차들을 여럿 부수는 전과를 발휘하여 훈장을 받고 이렇게 수도에서까지 기념되고 있었다. 요즘 시대에 전쟁 영웅이라니, 비현실적으로 다가오면서도 이게 사실 이게 오래되었으면서도 새로운 현실이려니 싶었다.

길을 또 걷다가 등장한 기념물. 무언가 해서 구글 지도로 찾아 보니 정치적 폭력의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 기념물인 '슬픔의 벽'이었다.

얼굴 없는 사람들은 아마 수많은 무명의 희생자들을 뜻하겠고, 옆의 글자는 rember, pomni 등 소련 각 민족과 세계 여러 언어로 '기억하라'라고 쓰여 있다. 정부 청사들이 있는 중요한 위치에 이런 '불온한' 기념물이 있어도 되나? 해서 확인해 보았는데 이 기념물은 놀랍게도 러시아 연방 정부와 푸틴 대통령의 재가로 건립된 것이었다. 그것도 러시아 혁명 100주년을 맞이한 2017년에 말이다. 주로 러시아의 정부 비판가들의 입장을 싣는 영어권 자료에 따르면, 푸틴이 이 기념물을 건립한 의도는 소비에트 시대의 기억에 대한 현 러시아 민족주의의 모순적인 시각을 반영한다고 한다. 그 시기는 영광의 역사기도 하지만 실패와 비극의 역사기도 하다. 후자를 지우기에는 너무나 명확한 증거와 자료와 기억이 있다. 그래서 푸틴은 후자를 정치적으로 해가 되지 않는 최소한의 선에서만 기념하고, 압도적으로 전자를 국가 정체성의 코드로 내세우며 활용한다. 이 기념물에 희생자만 있지 가해자가 없다는 점에서, 소련 시절에 자행된 억압의 책임으로부터 러시아인과 러시아 체제를 해방시키려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것이다.

그 뒤 수하렙스카야 역에서 전철을 타서 노보슬로보드스카야로 향했다. 거기에 케이팝 카페가 있다고 지도에 나와 있었기 때문이다. 러시아에서 본 케이팝의 흔적은 다른 글에서 포스팅하기로 하고. 노보슬로보드스카야 역에서 조금 위로 향하면 '프쿠스노 이 토치카(vkusno i tochka)'라는 식당이 나온다. 알 사람은 다들 알겠지만 이 식당은...



맥도날드가 러시아의 '특별군사작전'으로 러시아에서 철수한 이후 러시아 현지에서 맥도날드가 남기고 간 인프라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러시아판 맥도날드'다. 뜻부터가 상징적인데, 대충 '맛있으면 그거로 끝'이라는 뜻이다. 맛은 뭐 맥도날드랑 거의 흡사했다. 메뉴 다양성이 줄어들고 콜라 디스펜서는 페트병 콜라로 대체되는 사소한(?) 차이들이 있었지만.
그러고 보면 KFC나 버거킹은 전부 정상 영업을 하는데 맥도날드와 스타벅스는 철수했다. 어째 미제 자본주의의 상징이라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다시 전철을 타고 고리키 공원이 있는 옥탸브리스카야 역으로 향한다. 이름에서부터 10월 혁명을 기념하겠다는 느낌이 든다. 전철 맞은 편에는 카리스마 넘치는 거대한 레닌 동상이 서 있다. 다시 반대 방향으로 꺾어서 걷다 보면

고리키 공원의 거대한 정문이 나온다. 이 사람들은 대체 왜 공원 정문을 이렇게 위압적이고 웅장하게 건설하고자 했을까... 사진에는 못 담았지만 옆에 거대한 러시아 국기 게양대가 펄럭이는 걸 보자면 허탈한 웃음마저 나온다.


맑은 날의 고리키 공원은 굴랴찌하러 나온 사람들로 가득했다.

고리키 공원 바로 옆에는 모스크바를 상징하는 강인 모스크바 강이 흐른다. 모스크바 강은 볼가강의 상류에 위치해 있다. 전통 시대에는 아마 이 강을 따라서 무역상들이 오갔을 것이다.

내 기억이 맞다면 맨 왼쪽의 거대한 건물은 러시아 국방성이다. 아마 지금 안 좋은 의미에서 분주히 일하고 있을 것이다.
이 동네를 걸을 때 들은 음악은 스콜피온즈의 Wind of Change다. 서독의 밴드 스콜피온즈는 독일이 통일되는 것을 보고 소련 체제가 개방하는 것을 보며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것을 직감했다. 스콜피온즈는 냉전으로 갈라진 서유럽과 동유럽이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모습에 감격했는데, 바로 그 노래를 상징하는 장소가 '모스크바 강'과 '고리키 공원'이다.
Follow the Moskva
Down to Gorky Park
Listening to the wind of change
An August summer night
Soldiers passing by
모스크바 강을 따라
고리키 공원으로 내려가며
변화의 바람을 듣는다
8월의 여름 밤에
병사들이 지나가고...
이 노래를 듣다 보면 1989년 무렵 서구인들이 공유했던 '역사의 종언'의 정서가 무엇인지가 생생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지금은 '머나먼 기억을 과거에 묻자'고 하고 '내 기타가 말하기 원하는 것을 네 발랄라이카로 연주해라'라는 스콜피온즈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가 되었다.

트레챠코프 근처를 걷다가 발견한 지멘스. 아마 지금 무척 어려울 것 같다..

그 옆에는 러시아가 개발한 독자 결제 시스템 미르 회사가 보인다.

크렘린과 붉은 광장 쪽으로 향하는 길.
이때 3년 전에 뵈었던 아제르바이잔 선생님과 거닐었는데, '특별군사작전 이후로 관광객이 줄어서 쾌적해지기는 했다'라는 씁쓸한 멘트를 남겨주셨다.

러시아의 위대한 화가 레핀의 동상.



러시아의 그나마 유일한 자유민주주의 정당인 야블로코(사과) 당사인 것 같았다. 당사 옆에는 기념 식수도 있었다.
목적 없는 정처 없는 굴랴찌는 보람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