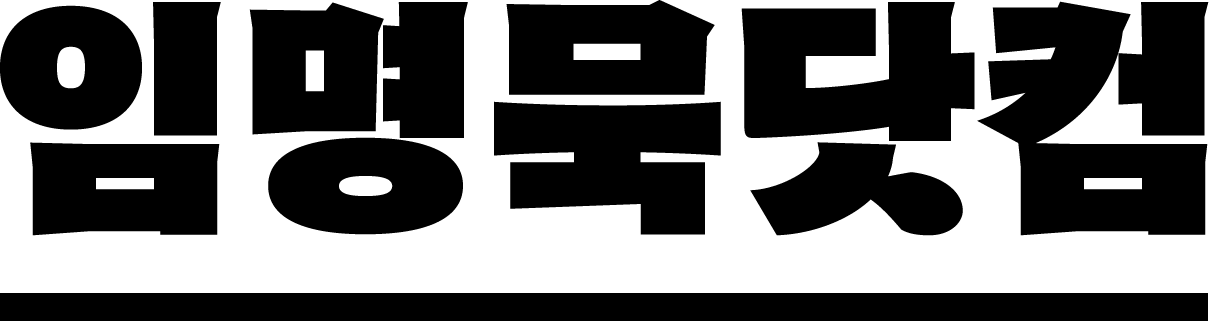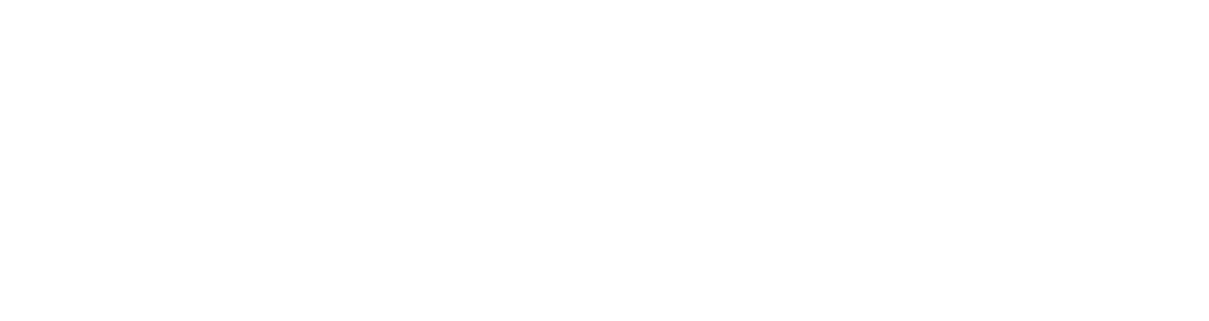남양탐방 - 발리 (4)
마르가라나 국립 추모 공원

숙소에는 가네샤 석상이 있었다. 가네샤가 여기저기 있는 것이 집을 지켜주는 신 느낌으로 많이 놓는 것 같았다. 가네샤 신의 배웅을 받으며 다음 일정으로.

숙소 바로 앞에는 논을 바라보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었다. 클리포드 기어츠가 말했던 농업의 내향적 정교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계단식 논 트래킹을 할 계획을 세우며 이때까지만 해도 싱글벙글하고 있었다.

우측 상단에 Tegalalang(떼갈랄랑)이 계단식 논을 1시간 반 정도 트래킹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저장해놓았다. 그 전에 방문하고자 했던 곳은 마르가라나 국립 추모 공원. 구스티 응우라 라이 중령이 네덜란드군에 맞서다가 전멸했던 마르가 전투가 일어났던 자리라고 한다. 당시 응우라 라이는 섬의 동쪽에서 네덜란드 군 기지를 습격하면서 게릴라 전을 전개하고 서쪽에 있던 마르가로 왔던 상황인데, 바로 그 때 덜란드군이 발리 섬에 있던 전군을 동원하여 독립군을 격멸하기로 결심했다. 네덜란드군은 북쪽 슬라웨시의 마카사르에서 항공기까지 동원하여 진압 작전을 펼쳤고, 상황을 바꿀 수 없음을 깨달은 응우라 라이는 푸푸탄(puputan)이라 불리는 발리 특유의 집단 자결을 수행했다. 물론 무저항의 자결 의식은 아니었고, 옥쇄를 각오한 최후의 전투라는 의미에서의 푸푸탄이었다 마르가 전투에서 응우라 라이를 포함한 96명의 독립군은 전멸했지만 그들의 분전으로 네덜란드군 400명이 사살당했다.

전투에서 승리한 네덜란드는 덴파사르에서 덴파사르 회담을 열고, 자바와 보르네오 동쪽의 모든 섬을 묶어 동인도네시아국을 독립시켜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했다. 그러나 식민지의 저항과 유럽 제국주의를 해체하고자 했던 미국과 소련의 압력으로 1949년에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의 독립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고, 동인도네시아국도 자바가 주도하는 독립 인도네시아에 합병되었다. 1954년에 정부는 마르가 전투를 기리며 전투의 현장에 응우라 라이의 영웅적 항전을 기념하는 추모 공원을 세웠다.

추모 공원 입구.

입구에는 인도네시아와 발리 독립군의 결의를 보여주는 상이 설치되어 있다.

맞은 편에는 아마 발리에서 독립 전쟁 와중의 전몰자들의 이름을 적은 것 같은데 인터넷 자료에 따르면 여기에 1372명의 묘가 있다고 한다. 붉은 색과 흰 색으로 위에 걸린 띠는 인도네시아 국기다.

입구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곳이 적도 근방 열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대한 나무가 서 있다. 여러 나무를 한 데 묶은 것 같았다.

공원 바깥의 크기에 비할 바는 안 되지만 이런 종류의 나무들이 꽤 많았는데 어떤 나무일지 조금 궁금해졌다.

8층에 17m 높이라는 이 기념탑은 8월 17일이라는 인도네시아 독립 기념일을 따서 만들었다고 한다.

좀 더 가까이 가면 응우라 라이 사진과 그를 기린 제단을 볼 수 있었다.

기념탑에서 오른쪽으로 빠지면 개방형 건물 안에 침대 같은 게 놓여 있었는데 별 다른 설명은 없었다. 뭔가 발리 귀족들은 이런 곳에 있었을 것 같은데..

묘역은 차분하게 조성이 잘 되어 있어서 산책하기 매우 좋았다.

발리의 학생들도 방문해서 나무를 타고 놀고 있었는데 딱히 견학 느낌은 안 나서 아마 인근 동네에 사는 학생들이 아닐까 싶었다.

이곳은 역사 기념관.

문이 잠겨 있어서 내부를 볼 수는 없었고, 창에 핸드폰을 대서 슬쩍 내부를 촬영할 수밖에 없었다. 응우라 라이 흉상이나 총, 관련 사진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 같았다. 아래부터는 묘지 사진들.



차분한 묘역을 걸으면서 인도네시아 독립 전쟁과 냉전의 여명, 제3세계 운동의 시작 등에 대해서 잠깐 형식적으로 생각해주었다. 남는 시간 대부분은 사진을 찍으며....

공원 밖을 나오니 동네를 거닐고 있는 닭이 보였다. 여기서 다음 행선지로 삼은 떼갈랄랑 계단식 논으로 향하는 택시를 잡기로 했다. 이곳은 동남아시아답게 그랩과 고젝이라는 택시 어플이 아주 일반적인데 여기까지 오는데 대략 만삼천원 정도를 지불했던 것 같다. 그런데 어? 문제가 생겼다.

바로 한참을 지나도 택시가 잡힐 기미가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는 것..... 뒤에 생각해보니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외국인 관광객 따위가 올 것 같지도 않고, 번화한 도시도 아닌 그냥 발리의 한 마을에 택시 같은 게 다닐 이유가 전혀 없었다. 어차피 이곳 주민들은 다들 자차나 오토바이가 있으니까 택시 수요도 없을 것이고. 이 먼 곳까지 콜을 잡아서 더 머나먼 떼갈랄랑까지 가겠다는 기사도 있을 리가 없다. 푹푹 찌는 발리의 후덥지근한 공기를 스프라이트로 달래면서 일행과 나는 우리가 고립되었음을 실감했다...
대체 여기서 어떻게 나가지? 숙소까지는 25km 가량이니 사실 하루에 못 걸을 거리는 아니긴 하다. 온갖 생각이 머리를 스치는 가운데 우리는 마르가 공원 앞에서 "혹시 어디 가? 택시 태워줄까?"라고 호객 했던 아저씨 하나가 생각났다. 우리는 그때만 해도 그랩 어플로 정가로 택시를 탈 생각을 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대충 넘어갔는데, 아 차라리 돈 좀 더 주고 그거 잡을 걸 하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었다.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혹시라도 그 아저씨나 비슷한 택시 호객꾼이 있지 않을까 하고 다시 방향을 돌려 공원으로 돌아갔다.
돌아가니 택시 호객꾼과 유사해보이는 그 어떤 존재도 찾을 수 없고, 추모 공원 앞에는 응우라 라이 장군과 그 동료들의 영령들 밖에 없었다. 고요와 적막만 있었다는 말이다. 아 이거 대체 어떻게 하나라면서 마음이 좀 급해지는 사이에, 추모 공원 왼쪽의 가정집 앞에서 마을 사람들이 무언가 분주히 목공 작업을 하는 것을 보았다. 저분들에게 일단 물어나 보자 해서 무례한 외국인 관광객의 정석대로 일단 영어로 말을 걸었다.
"Excuse me...."
그러더니 갑자기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아저씨가 나와서 무슨 일이냐고 살갑게 물어왔다. 자기는 호주 브리즈번을 오가며 일을 하는지라 영어를 좀 할 줄 안다고 했다. 사실 발리 관광지에만 있으면 이 사람들 영어 진짜 잘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정말 찾기가 어려웠다. 아, 우리가 정말 말도 안 통하는 곳까지 들어왔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하며 "떼갈랄랑에 가고 싶은데 택시가 없어서요."라고 답했다.
"이곳엔 택시가 안 와. 그리고 떼갈랄랑 간다고 해도 거기도 택시 다니는 데 아니거든. 발리 여행하겠다고 무턱대고 그랩 잡고 아무 데나 일단 가버리면 안 돼. 이런 곳 올 거면 아예 하루를 대절을 해서 다니는 게 맞지. 니들은 지금 떼갈랄랑 얘기할 게 아니라 숙소로 어떻게 돌아갈지 그 생각을 해야하는데 말야."
친절한 아저씨의 친절한 타박을 들으며 그래 숙소나 가자 젠장 하면서 다시 물어보았다.
"그럼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너네 숙소가 어느 쪽이지?"
"짱구요."
"짱구.. 우리 마을 사람들한테 혹시 짱구까지 태워줄 사람 있나 찾아볼게. 돈은 얼마 쯤 내려고?"
"20만 루피아(1만 6천원) 어떻습니까?"
"거기까지 1시간 가고 태워줄 사람이 여기까지 돌아오는 데 또 1시간 걸리는데 그 돈으로는 못 가지. 50만 루피아는 내야 될 걸."
"네... 태워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그러면 지금 바로 갈 수 있는 건가요?"
"지금은 바로 못 가."
여기서 다시 한 번 동공지진. 아니 그럼 언제 갈 수 있단 말인가?
"지금 마을에서 의식(ceremony)을 하는데 그거 끝날 때까지 사람들이 마을에서 움직일 수 없어."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계획이 틀어져서 턱 막혔던 가슴이 시원하게 뚫렸다. 발리에서 나름 가믈랭 음악이나 힌두교 의식 같은 거 한 번은 보고 싶었는데, 그다지 기회가 없어서 아쉬워하던 차, 아예 관광객도 별로 없는 곳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볼 수 있게 된 것 아닌가.
"그거 보려면 어디로 가야하죠?"
"음 여기서 큰 길로 나가서 왼쪽으로 돌면 사원이 있는데 거기서 볼 수 있을 거야. 끝나고 여기로 다시 올라오면 내가 한 번 니들 태워줄 사람 있나 찾아볼게."

큰 길로 나가니 왼쪽으로 돌 필요 없이 이미 사람들이 줄줄이 행진을 하면서 오른쪽으로 걷고 있었다. 대체 무슨 의식인지는 모르겠지만 행진에 우리 같이 확 튀는 외지인이 끼는 것도 별 신경 쓰지 않는 듯 했다.

이런 징이나 장구 같은 각종 악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분주히 연주를 하면서 갔는데 무척 흥겨웠다. 남녀노소가 다 열심히 걷는데 이런 악기는 주로 젊은 남자 혹은 아예 어린 청소년들의 몫인 것도 같았다.

열심히 걸어서 목적지 사원까지 도착. 찍으려고 하니까 따봉을 들어주시는 분들에 감사했다.

사원 앞에서는 악기를 든 사람들이 흥겨운 연주를 계속 이어갔고, 무슨 공물 같은 것을 든 사람들이 사원으로 연달아 들어간 다음에 의식을 치르고 다시 나와서 원래 왔던 길을 돌아가기 시작했다. 우리는 의식 도중에 사원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의식이 다 끝나고 사원을 둘러보았다.

저기 안쪽에 영어를 매우 잘하는 할아버지가 있어서 이 의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것저것 묻기도 했었는데, 솔직히 배경 지식이 전혀 없다보니 짧은 대화로 뭔가를 알아낼 수는 없었다.


뭐랄까 우리한테 친숙한 느낌이기도 하면서도 인도 양식 같은 게 가미되어 있는 아름다운 사원들이었다. 관광객들 사이에서 유명한 곳은 전혀 아니고 당연하게도 외국인은 우리 밖에 없었지만 그래서 더욱 값진 경험이었다. 오히려 택시를 잡지 못해서 이런 귀중한 체험도 할 수 있었으니, 웃돈으로 들어가는 택시비는 의식 관람료로 생각하며 마음을 편히 먹었다. 짱구 숙소로 돌아오니 해가 뉘엇뉘엇 넘어가고 있었는데 돌아오는 길은 긴장이 탁 풀려서 발리의 끔찍한 도로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내 잤다.

발리의 마지막 날. 인도네시아식 고기 커리라는 렌당인데, 갈비찜 느낌 나서 무척 맛있게 먹었다. 반대로 갈비찜도 한국식 렌당이라고 팔아먹을 수도 있겠거니...

발리를 떠나는 길. 발리 덴파사르 공항의 이름이 바로 응우라 라이 공항이다. 처음에 입국할 때만 해도 덴파사르 공항이라고만 생각했지 응우라 라이는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지나갔다. 그러나 발리 독립 기념관과 마르가 공원을 본 뒤에는 이 인물의 존재감을 새삼 더 잘 느낄 수 있었다. 차를 타고 공항에 들어가는 와중에 응우라 라이 동상이 우뚝 서 있는 것을 보았다. 택시 하차장에서 다시 길을 거슬러 올라 차도 건너편에서 보이는 응우라 라이를 찍었다. 한 민족의 서사와 영웅,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는 방식을 공부하는 것은 언제나 흥미로운 일이다.

발리 공항 출국장에 자리한 'Yangnyeom Chicken'. 그 옆에는 일본식 라멘집이 있었다. 현해탄을 마주한 한일은 하나임을 다시 상기하며... 발리를 떠날 준비를 했다.
물론 발리를 떠난다고 해서 한국으로 바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었다. 적도를 통과해 발리까지 내려왔는데 그냥 돌아가기에는 조금 아까웠다. 그 다음 행선지는 반 년 전인 7월 달에 방문했던 곳, 태국이었다.